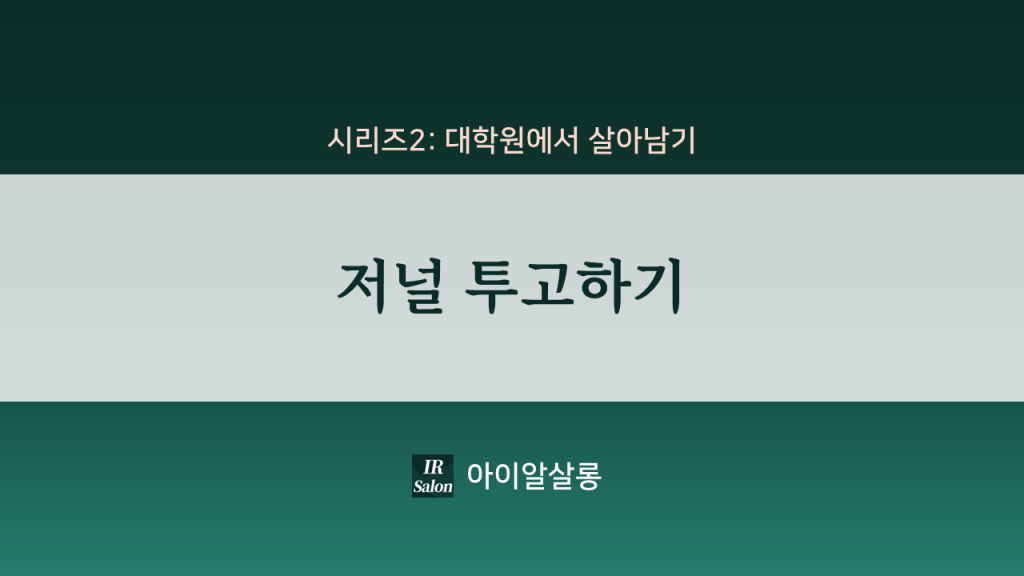
내 연구 세일즈하기 (BY 등대지기)
이번 글에서는 대학원에서 생산한 결과물(글 혹은 연구)을 어떻게 세일즈(?) 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수단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많은 대학원생들이 석사를 졸업하고 난 후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석사학위논문을 ‘어떻게 이용해볼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아끼면 ㄸ 된다), 가장 흔한 방법이 저널에 “투고”하는 것이다. 참고로 본 글은 미국과 한국의 정치학 관련 학회 및 저널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컨퍼런스/학술대회
컨퍼런스는 자신이 진행 중인 연구를 대중 앞에서 발표하고, 그에 대한 토론이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사람들 생각은 모두 비슷하다고 했던가… 컨퍼런스의 중요성은 저널 투고와도 매우 연관성이 높은데, 이는 컨퍼런스 발표를 통해 리뷰어들로부터 받을 법한 코멘트를 미리 들을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진행 중인’ 연구를 컨퍼런스에서 소개하고, 이에 대해 피드백을 받아서 연구를 미리 보완하는 것이 저널에 제출한 ‘완성된’ 수준의 연구를 수정하는 것보다 더 쉽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컨퍼런스는 자신이 관심 있었던 주제에 아주 최신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평소 관심 있었던 주제의 연구자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필자도 한 학술대회에서 관심 있었던 교수님을 만나 연구를 소개하게 되었으며, 많은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 덧붙여, 자기 PR의 시대 아니던가? 학술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PR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점 중 하나이다.
저널(journal)이란?
다음으로는 대학원생이라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저널(=학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저널은 학자들의 주장, 해당 연구 분야의 최신 동향, 논쟁 등 연구의 산출물을 관심 있는 독자들이나 대중에게 출판하여 공개하는 ‘논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를 학술지에 투고함으로써 자신의 주장과 이에 대한 논증 방법을 공개적으로 밝히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당 분야 혹은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연구를 소개하는 저널들에 대해서도 소위 ‘좋은 혹은 좋지 않은’ 등의 수식이 붙기도 한다. 좋은 저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측면에서 토론이 진행되지만, 가장 간단하게는 그 저널이 인용 색인(Citation Index)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어느 인용 색인인지를 통해 일차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의 국제적인 학술지의 경우에는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라는 색인이 있다. 약 50여 개의 분야에서 3,400개의 저널을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진 이 색인은 저널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선별된다. 물론 SSCI 외에 SCOPUS나 다양한 지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SSCI급 학술지만이 좋은 저널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국제적인 인지도를 얻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연구자들, 명성 있는 학자들이 투고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많은 한국의 영문 학술지들도 리뷰 방식을 더욱 세심하게 변경하거나 인용이 많이 되는 연구들이 출간되게끔 하는 등 SSCI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간하는 정치학 분야 저널로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발간하는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Asian Perspective 같은 저널들이 SSCI급 학술지로 자리매김해 있다.
저널들은 통상적으로 학회, 연구소, 기관 등에 의해 운영되며, 운영 주체의 의도에 따라 특정한 취향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저널의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X10,000 중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가장 큰 정치학 관련 학회 중 하나인 ISA(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에서는 총 7가지의 저널들을 관리하고 있다. 그중 하나인 Global Studies Quarterly(GSQ)는 “방법론적 접근부터 국제정치의 질문들”까지 국제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ISA의 또 다른 저널인 Foreign Policy Analysis(FPA)는 넓은 범주의 “외교정책”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하는 저널이라는 점에서 GSQ의 주제와는 사뭇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더욱 극명한 차이는 China Quarterly 같은 저널처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저널들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투고(submission)와 심사(review)란?
저널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저널의 큰 방향성과 주제를 설정한다면, 보다 세부적인 운영과 집행은 편집장(Editor in Chief)에 의해 이뤄진다. 그렇기에 편집장이 해당 저널에 투고된 연구를 심사하는 데 있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여타의 심사위원들이 반대한 연구가 편집장의 권한으로 통과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물론 해당 연구는 높은 수준의 검증을 통과한 연구였고, 아무 연구나 그렇게 편집장 직권으로 통과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편집자와 별도로 편집이사회(또는 편집위원회, Editorial Board)에서는 저널의 운영 방향성을 점검하고 투고된 연구들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유명하고 영향력이 높은 저널일수록 수백 혹은 수천 편이 투고되기 때문에 이를 일차적으로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10명 이하의 편집장들이 일일이 모든 연구를 읽으면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편집간사(Associate 혹은 Assistant Editor)가 존재한다. (대부분 편집장은 해당 분야에서 유명한 교수급이고 편집간사의 경우 갓 박사를 딴 학위자나 박사학위 과정생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편집간사들이 일차적으로 연구들을 편집이사회에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저널 측에서 투고를 거절하는 것(reject)을 데스크 리젝이라고 한다. 보통 미국 학술지의 경우에는 데스크 리젝을 통과하는 것이 목표일 정도로 본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힘들며 이러한 비율은 투명성을 위해 저널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고 있다. 이후 데스크를 통과했다면 편집간사들은 해당 연구를 심사해줄 전문가들을 물색한다. 이 심사자(Reviewer)들은 편집이사회에 소속된 연구진이거나, 편집이사회에 소속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연구를 정말 잘 검토해줄 수 있는 전문가일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2명 이상의 심사자에게 심사의견을 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저널을 peer-reviewed journal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연구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저자와 논쟁함으로써 더 나은 연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해적학술지나 돈만 내면 연구를 실어주는 학술지들이 왜 욕을 먹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심사과정 자체가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기로 유명하며 저널 내부적으로 관련 리뷰어들을 배정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면 전체 심사과정에 1~2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또한 리뷰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투고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1~2년의 시간이 지나고 리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혹자는 리뷰 후 리젝보다 데스크 리젝을 받고 수정한 후에 다른 학술지에 제출하는 것이 심적으로 편하다고 할 정도이다. 반면 리젝이 아니라면 보통의 경우 수정 후 재심(Revision and Resubmit, R&R)을 받을 것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약간의 수정 후에 게재하는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 학술지에 제출하는 연구자들은 대부분 R&R을 목표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보통 R&R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게재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위에 서술한 과정은 미국 학술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필자는 미국과 한국 학술지 모두 경험을 가지고 있다. 미국 학술지에서는 데스크 리젝을 받았으며 한국 학술지에서 게재되었다. 특히 유사한 주제의 논문에 대해서 많은 데스크 리젝을 받았지만 매우 운이 좋게도 데스크 리젝 단계에서도 담당 편집간사의 리뷰를 받을 수 있었다. 이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이기는 하나, 연구에 대한 코멘트의 질이 매우 높고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 이 밖에 한국 학술지가 미국과 다른 점은 다수결이라는 것이다. 한국 학술지에서는 3명의 심사자에게 리뷰를 받았는데 한 심사자가 혹독한 리뷰와 함께 게재불가 결정을 주었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의 심사자에게 좋은 심사를 받아 게재가 확정되었다는 점은 심사자들의 평가를 전반적으로 고려하는 미국 학술지와는 달리 -1 + 1 +1 의 느낌으로 좋지 않은 리뷰어의 결정을 뒤엎을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소감과 당부
첫 번째, 세상에 학술지는 많으며 연구자도 많다. 데스크 리젝 비율이 90%나 되는 악명 높은 학술지들도 존재한다지만, 뒤집어 본다면 매회 10%는 합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분기별로 발간되는 학술지는 1년에 네 번의 기회가 있으며, 항상 “누군가의 연구는 실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누군가가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은 노력하는 자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명심했으면 한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말자. 연구는 어렵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던 학부생 시절 때 연구가 제일 쉬웠던 것 같다. 누군가는 학술지에 글을 싣게 되지만 누군가는 리젝을 당하거나 떨어진다.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남과 비교하며 살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자세는 필요하다. 정 이러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겠다면, ‘나도 언젠가는’이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하자. 그렇다면 언젠가는 우리 모두 좋은 학술지에 한 편, 두 편씩 글이 실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마지막 당부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필자는 한국인이고, 영어는 나의 모국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를 쓰면서 국제학술지에 영어 논문을 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것이다. 바로 더 많은 사람에게 내 연구, 내 분야를 알리기 위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중요한 연구를 국내 독자들을 대상으로 소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교수 혹은 연구직 채용 과정에서 매겨지는 연구 실적은 공저보다는 단독일수록, 그리고 SSCI급 국제학술지에 실린 것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하지만 국내 정치학계도 좋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국내 학술지를 통해서 드러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는 것과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은 천양지차라고 생각한다.
댓글 남기기